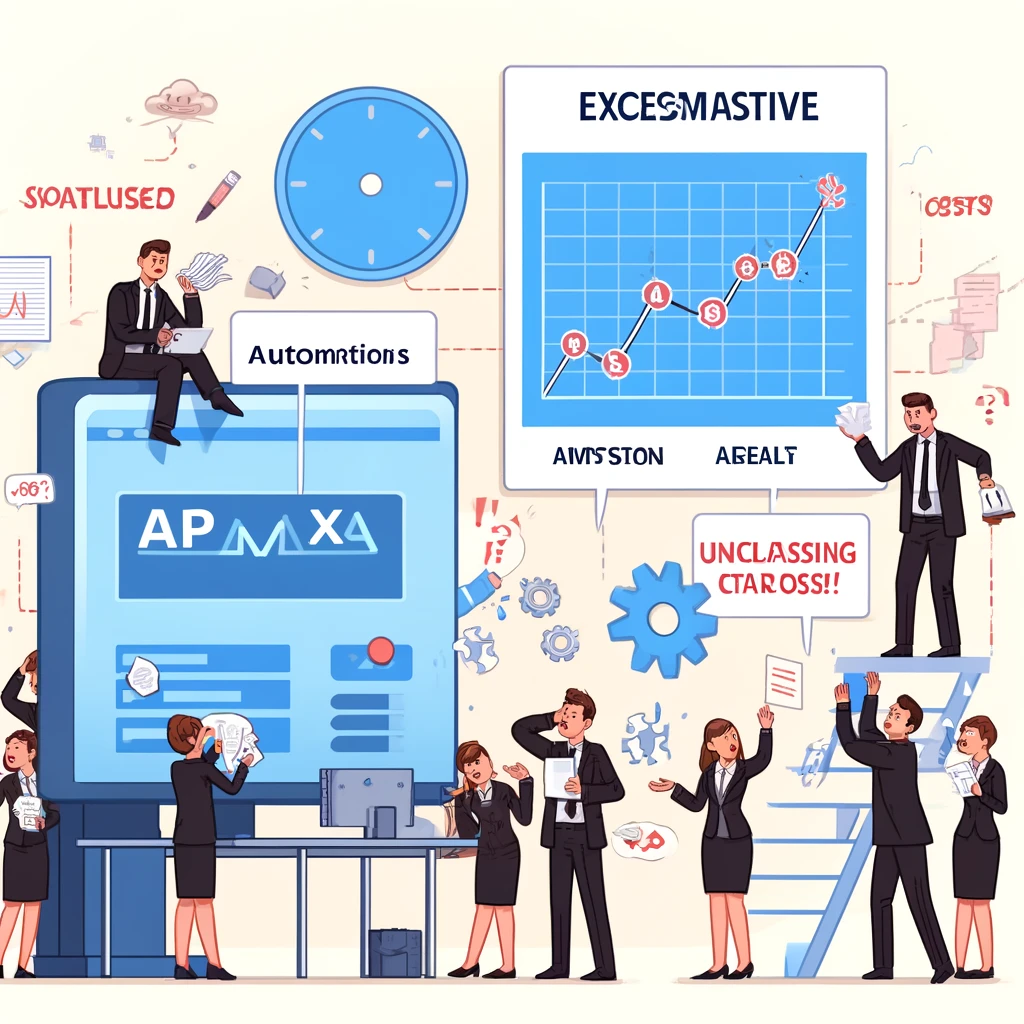왜 한국에서는 천재가 나오기 어려운가
— 교육, 조직, 그리고 프로젝트가 발목을 잡는다
“한국은 공부 잘하는 나라다.”
사교육비 세계 1위, 초등학생 때부터 문제풀이 스킬을 연마하고, 서울대는 고등학교 수석들이 모인 곳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에서 왜 ‘세계적인 천재’는 보기 힘들까?
왜 우리는 스티브 잡스도, 일론 머스크도, 아인슈타인도 배출하지 못했을까?
1. 정답을 외우는 교육, 질문을 막는 문화
한국의 교육은 탁월한 ‘문제 해결자’를 양산한다.
수능, 내신, 문제집, 학원 — 모든 시스템이 정답을 얼마나 빠르게 맞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천재란 문제 자체를 바꾸는 사람이다.
질문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질문하는 순환 속에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보다 암기를, 실패보다 정답을 중요하게 여긴다.
틀리면 낙오라는 두려움이 모든 창의성을 잠재운다.
정답을 외우는 사람은 많지만, 문제를 바꾸는 사람은 자랄 수 없다.
2. 도전이 아니라 생존을 택하는 기업들
그렇게 교육을 통과한 인재들이 들어가는 곳은 조직이다.
하지만 회사는 학교보다 더 보수적이고 정답 중심이다.
- 실패는 곧 책임이다.
실험하고 도전하는 문화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네가 하자고 했잖아?” 한 마디면 모든 책임은 아래로 떨어진다. - 상명하복과 보고의 굴레
창의적인 의견보다 위에 보고할 내용이 중요하다. 설계보다 보고, 아이디어보다 결재라인이 우선이다. - 성과주의의 단기화
장기적인 혁신보다, 이번 분기의 숫자가 우선이다. 그래서 누구도 모험하지 않는다. 실험하지 않는다. 바꾸려 하지 않는다.
3. 설계할 시간을 주지 않는 프로젝트
최근 내가 겪은 프로젝트는 10개월간 설계할 시간이 있었다.
넉넉하진 않지만, 적어도 고민할 시간은 있었다.
그런데 회의 몇 번 뒤, 일정이 6개월안에 끝내는걸로 변경됐다.
그 결과는 뻔하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전 방식대로 가자.”
그간 쌓인 경험과 지식, 새롭게 설계하고 싶은 시도는 시간 부족이라는 벽 앞에서 무력해진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조직은 결국 과거를 복사하게 된다.
4. AI 시대, 정답형 인간의 몰락
이제 문제는 더 깊다. 세상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AI가 빠르게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AI가 가장 잘하는 일은 바로 정답을 빠르게 찾고, 계산하고, 반복하는 일이다.
한국의 교육과 조직은 그동안 이런 능력을 가진 인재를 ‘우등생’으로 길러왔다.
하지만 그 우등생들이 이제 AI의 하위 호환이 되는 시대가 왔다.
- 영어 문법? 번역? AI가 더 잘한다.
- 수학 문제 풀이? 실시간 계산? AI는 더 빠르고 정확하다.
- 정형화된 업무, 보고서, 코드 작성까지… AI가 인간을 앞선다.
앞으로 살아남는 인간은 누구인가?
정답을 잘 찾는 사람은 AI에게 밀리고,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기존 틀을 의심하고, 사람과 맥락을 통찰하는 능력이다.
이건 AI가 아직 갖지 못한 영역이며,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이다.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정답을 잘 찾는 학생을 뽑고,
실패하지 않는 직원을 선호하고,
시간 없는 프로젝트를 예전 방식으로 밀어붙인다.
하지만 이 방식은 AI 시대에 인간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 뿐이다.
천재를 키우는 사회는, 질문을 기다릴 줄 아는 사회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질문이 존중받는 교실,
- 실패가 허용되는 회의실,
- 생각할 시간을 주는 프로젝트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정답을 넘어, 방향을 제시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인재만이 AI 시대에도 살아남고, 더 나아가 AI를 이끌 수 있다.